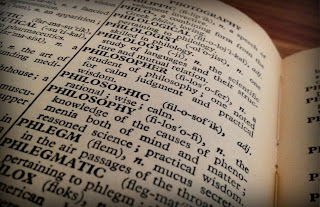Prompt 1: Some students have a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or talent that is so meaningful they believe their application would be incomplete without it. If this sounds like you, then please share your story.
에세이 주제1: 어떤 학생은 자신의 배경, 정체성, 관심사, 또는 재능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지원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본인 얘기를 공유해 주세요.
 |
| 예일, 콜롬비아, 유펜, 다트머스, 코넬, 스탠포드 합격한 브리트니 (출처: www.businessinsider.com) |
Managing to break free from my mother’s grasp, I charged. With arms flailing and chubby legs fluttering beneath me, I was the ferocious two year old rampaging through Costco on a Saturday morning. My mother’s eyes widened in horror as I jettisoned my churro; the cinnamonsugar rocket gracefully sliced its way through the air while I continued my spree. I sprinted through the aisles, looking up in awe at the massive bulk products that towered over me. Overcome with wonder, I wanted to touch and taste, to stick my head into industrialsized freezers, to explore every crevice. I was a conquistador, but rather than searching the land for El Dorado, I scoured aisles for free samples. Before inevitably being whisked away into a shopping cart, I scaled a mountain of plush toys and surveyed the expanse that lay before me: the kingdom of Costco.
엄마의 손을 간신히 뿌리친 나는 달렸다. 팔을 마구 휘드르며 통통한 다리를 허둥거리며 뛰어가는 나는, 토요일 아침 코스코 매장을 맹렬하게 휘젓고 다니는 사나운 3살짜리였다. 내가 츄러스(줄행랑을 칠 때 공기를 우아하게 가르며 날아가는 계피설탕 로케트)를 투하해버리자 엄마의 눈은 공포로 휘둥그레졌다. 내 머리 위로 높이 솟은 대형 벌크 크기의 물건들를 경외감을 가지고 올려다 보며 나는 복도를 달려갔다. 경이로움으로 가득찬 나는 만지고, 맛보고, 업소용 냉동고 속으로 머리를 집어 넣어 모든 빈틈을 탐험하고 싶었다. 나는 (16세기 남미를 탐험한) 스페인 정복자였다. 하지만, 엘도라도를 찾기 보다는 시식코너를 찾아 복도를 뒤집고 다녔다. 불가피하게 카트 속으로 잡아채어지기 전까지, 나는 털인형의 산을 등반했으며 내 앞에 펼쳐진 광활한 대지를 답사하고 다녔다. 여기는 바로 코스코 왕국.
Notorious for its oversized portions and dollarfifty hot dog combo, Costco is the apex of consumerism. From the days spent being toted around in a shopping cart to when I was finally tall enough to reach lofty sample trays, Costco has endured a steady presence throughout my life. As a veteran Costco shopper, I navigate the aisles of foodstuffs, thrusting the majority of my weight upon a generously filled shopping cart whose enormity juxtaposes my small frame. Over time, I’ve developed a habit of observing fellow patrons tote their carts piled with frozen burritos, cheese puffs, tubs of ice cream, and weightloss supplements. Perusing the aisles gave me time to ponder. Who needs three pounds of sour cream? Was cultured yogurt any more wellmannered than its uncultured counterpart? Costco gave birth to my unfettered curiosity.
엄청난 양의 1인분과 1.5불짜리 핫도그 콤보로 악명이 높은 코스코는 소비지상주의의 정점이다. 카트에 실려 끌려다녔던 시절부터 높고 고결한 시식코너 쟁반이 닿을 정도로 키가 컸을 때까지, 코스코는 내 인생 내내 변함없이 존재했던 세상이다. 베테랑 코스코 고객으로서, 풍성하게 실은, 그리고 내 작은 체구와 대조가 되는 거대한 카트에 내 체중의 대부분을 드리밀며 나는 식료품 코너를 항해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냉동 뷰리또, 치즈 공과자, 아이스크림통,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가득찬 카트를 끌고 다니는 동료 단골들을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각 코너를 면밀히 관찰하는 건 나에게 사색의 시간이기도 했다. 1키로짜리 사워크림은 도대체 누가한테 필요하지? 유산균 배양 요거트는 배양 안 된 요거트보다 품행이 단정한가? (‘배양된’이란 뜻의 cultured가 “교양있는” 뜻도 있으므로.) 코스코는 나의 구속받지 않은 호기심의 산지다.
While enjoying an obligatory hot dog, I did not find myself thinking about the ‘all beef’ goodness that Costco boasted. I instead considered finitudes and infinitudes, unimagined uses for tubs of sour cream, the projectile motion of said tub when launched from an eighty foot shelf or maybe when pushed from a speedy cart by a scrawny seventeen year old. I contemplated the philosophical: If there exists a thirtythree ounce jar of Nutella, do we really have free will? I experienced a harsh physics lesson while observing a shopper who had no evident familiarity of inertia's workings. With a cart filled to overflowing, she made her way towards the sloped exit, continuing to push and push while steadily losing control until the cart escaped her and went crashing into a concrete column, 52” plasma screen TV and all. Purchasing the yuletide hickory smoked ham inevitably led to a conversation between my father and me about Andrew Jackson’s controversiality. There was no questioning Old Hickory’s dedication; he was steadfast in his beliefs and pursuits – qualities I am compelled to admire, yet his morals were crooked. We both found the ham to be more likeable–and tender.
거의 의무적으로 먹는 핫도그를 즐기던 나는 코스코가 자랑하는 ‘순 살코기’라는 선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유한성과 무한성 (수학/철학 개념), 상상도 안 해본 한 통의 사워크림 사용법, 2미터 넘는 선반에서 발사된 그 통이 내 카트 안으로 던져졌을 때나 삐적마른 17세 소녀에 의해 빠르게 달리는 카트 안에서 그 통이 그리는 궤적을 생각했다. 난 철학적인 내용에 대해 곰곰히 생각했다: 저기 용량이 1키로인 너텔라병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관성의 작용원리에 대해 아무 개념이 없는 한 고객을 보고 난 물리법칙을 끔찍하게 경험했다. 한 여자가 넘쳐나는 카트를 경사진 입구로 끌고 가면서도 카트를 계속 밀다가 점점 콘트롤를 놓쳐 결국 시멘트 기둥, 52인치 플라즈마 TV 등에 돌진해 버린 거다. 크리스마스 시즌 히코리 훈제 햄 구매는 결국 앤드류 잭슨(미국 7대 대통령)의 논란에 대한 아빠와의 대화로 이어져 갔다. 올드 히코리(앤드류 잭슨의 별명)의 헌신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인의 굽히지 않는 (노예제도 혹은 원주민 관련 내용) 믿음과 그 실현하려는 노력은 내가 높이 사는 자질이다. 하지만, 그의 도덕성은 옳지 않았다. 아빠와 나나 히코리 햄이 (올드 히코리 앤드류 잭슨보다) 더 마음에 든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더 부드럽기도 하고 (앤드류 잭슨은 본인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므로).
I adopted my exploratory skills, fine tuned by Costco, towards my intellectual endeavors. Just as I sampled buffalochicken dip or chocolate truffles, I probed the realms of history, dance and biology, all in pursuit of the ideal cart–one overflowing with theoretical situations and notions both silly and serious. I sampled calculus, crosscountry running, scientific research, all of which are now household favorites. With cart in hand, I do what scares me; I absorb the warehouse that is the world. Whether it be through attempting aerial yoga, learning how to chart blackbody radiation using astronomical software, or dancing in front of hundreds of people, I am compelled to try any activity that interests me in the slightest.
나는 코스코에 의해 정밀하게 다듬어진 내 탐험능력을 지적활동에 적용했다. 내가 버팔로 치킨 소스나 초코렛 트러플을 시식하듯이, (때로는 장난기 섞일 때도 있고, 때로는 심각할 때도 있는) 이론적 상황과 개념이 흘러넘쳐나는 이상적인 카트를 만들기 위해 나는 역사, 춤, 그리고 생물의 영역을 탐색했다. 그 밖에도 미적분학, 크로스컨츠리 달리기, 과학 연구 등 이제 모든 가정에서 애용하는 것들도. 손에 카트를 잡은 채로, 난 내가 두려운 일을 시도한다. 바로 (코스코와 같은) 대형창고인 이 세계를 섭렵하는 거다. 스카이요가 시도를 통해서든, 천체물리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흑체 방사능 차트 그리는 법을 배울 때든, 또는 수 백명 앞에서 춤을 추든, 나는 내 흥미를 조금이라도 끌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고만다.
My intense desire to know, to explore beyond the bounds of rational thought; this is what defines me. Costco fuels my insatiability and cultivates curiosity within me at a cellular level. Encoded to immerse myself in the unknown, I find it difficult to complacently accept the “what”; I want to hunt for the “whys” and dissect the “hows”. In essence, I subsist on discovery.
이성적 사고의 한계를 넘는 탐험과 배움에 대한 나의 강한 욕구, 이것이 나를 정의한다. 코스코는 나의 이런 탐욕에 부채질을 하고 내 안 구석구석의 호기심을 개발한다. 미지의 세계에 몰두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나는 안일하게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견딜 수 없다. 나는 “왜”를 사냥해서 “어떻게”를 해부하고 싶다. 본질적으로 나는 발견을 먹고 산다.
(번역: Kew Park)
<Take-away Points>
1. 두 살 때 코스코에 간 얘기로 시작. (너무 어렸을 때 얘기 쓰면 안 된다고 많이들 그러던데? 학원에서 정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함.)
2. 통통튀는 호기심 많고 재미있는 여학생이라는 걸 보여줬다. (대단한 장점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글이 본인에 대해서 재밌으면 된다.)
3. 구체적인 스펙 자랑이 하나도 없다. (어차피 레주메와 성적표에 다 나온 얘기 여기다 또 쓰면 자원활용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학생으로 생각한다.)
4. 훌륭한 스펙의 학생이 에세이 토픽으로 잡은 것이 코스코 쇼핑. (이정도 스펙을 가진 많은 학생은 그 대단한 스펙 중 하나에 대해 주로 쓴다. 예를 들어,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한 얘기. 봉사활동 에세이는 입학사정관들이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봤다. 벌써 10년 전에도.)
(번역: Kew Park)
<Take-away Points>
1. 두 살 때 코스코에 간 얘기로 시작. (너무 어렸을 때 얘기 쓰면 안 된다고 많이들 그러던데? 학원에서 정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함.)
2. 통통튀는 호기심 많고 재미있는 여학생이라는 걸 보여줬다. (대단한 장점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글이 본인에 대해서 재밌으면 된다.)
3. 구체적인 스펙 자랑이 하나도 없다. (어차피 레주메와 성적표에 다 나온 얘기 여기다 또 쓰면 자원활용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학생으로 생각한다.)
4. 훌륭한 스펙의 학생이 에세이 토픽으로 잡은 것이 코스코 쇼핑. (이정도 스펙을 가진 많은 학생은 그 대단한 스펙 중 하나에 대해 주로 쓴다. 예를 들어,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한 얘기. 봉사활동 에세이는 입학사정관들이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봤다. 벌써 10년 전에도.)